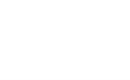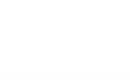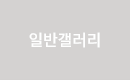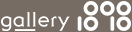-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 [하느님 계획 안에 있는 인간사랑 - 몸 신학 교리] ‘몸의 언어’와 ‘몸의 예언주의’ 표지와 내용 | 2025-11-19 |
|---|---|
|
“큰 신비”(에페 5,32)의 세 번째 요점인 ‘한 몸’은, ‘몸의 언어’와 ‘몸의 예언주의’를 드러내는 표지(標識)이며 내적 구성이다. 이는 사도 바오로가 성체성사의 선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토대로, 성경이 말하는 본래적 부르심과 배우자의 자기 증여를 다룬 부분이다. 부부의 구원적 사랑을 통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에페 5,31; 창세 2,24)이 되는 신비를 보여줬다. 교리서는 몸은 인간 주체성의 표현이므로 ‘한 몸’을 이루려면 배우자는 각각 ‘하나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페 5,28)이라는 말씀으로 이를 확인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에페 5,25)이 배우자 간 개별적 인격성의 경계를 흐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본질적인 ‘두 주체성’은 항상 ‘하나의 주체성’을 기초로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배우자에게 자신을 진실한 선물로 내어주며 자신의 참된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의해 자신을 잃거나 잠식당하게 된다. 그렇게 된 경우는 ‘한 몸’도 일치도 아니다. 신랑 신부의 친교 행위로 표현되는 몸의 언어는 성사적 표지의 기초이자 그 중심이며 내용이다. 교회는 오랫동안 신랑 신부가 몸의 언어 없이 혼인 서약만으로 ‘혼인이 완전히 성립될 수 있느냐?’라는 신학적 논쟁을 이어왔다. 그 이유는 혼인 서약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준비 단계에선 성사적 표징이지만, 육체적 결합 없이는 완전한 혼인으로 볼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예식 중 이뤄지는 혼인 동의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겠다는 지향의 질서 안에 있는 순간이고, 혼인은 서약의 교환과 육체적 결합을 통해 비로소 완결된다고 봤다. 혼인 서약은 혼인 성사의 ‘형상’이 되고 남편과 아내의 몸은 ‘질료’가 된다. 그들은 스스로 고백하고, 육체적 결합을 통해 고백을 실제화한다. 따라서 혼인 서약의 교환은 지성과 의지 그리고 의식과 마음의 수준에 따라 영적 실재인 사랑, 증여, 충실함을 표현하지만, 몸의 언어 없이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 지성과 의지의 영적 표현은 그에 상응하는 육체적 표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신랑 신부가 증인들 앞에서 하는 서약 “당신을 내 아내/남편으로 맞아들여, …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겠습니다”를 표지의 측면에서 혼인의 성사성으로 분석했고, 이 표지에 담긴 몸의 언어는 창세기(2,23-25 참조)에 기원을 두고, 에페소 서간(5,21-33 참조)에서 그 최종 완성을 만나게 된다. 혼인 반지를 교환할 때 “나 누구는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반지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한다. 이는 그들 사랑의 기원과 지향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음을 말한다. 둘이 하나 되는 긴장 안에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실제로 드러나며, 인간 존재의 신비가 스스로에게 계시되는 놀라움을 체험하게 된다. 반지를 끼워줄 때, 배우자가 절반을 건네고, 당사자가 반지를 깊이 밀어 넣는다. 이는 두 주체가 자유로운 인격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행위의 표현으로, 그 안에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네, 제가 당신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말한다. 남자와 여자의 몸은 “성사 이전의 성사입니다(Presacramento). 오직 영원한 사랑의 가시적 표지입니다.”(「트리티코 로마노(Trittico romano)」, II, 3)
|
|
| [가톨릭신문 2025-11-19 오전 9:12:31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