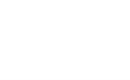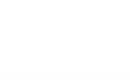-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 [독자마당] 맨 끝에 여는 문 | 2025-11-19 |
|---|---|
|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은 기를 쓰고 배운다. 그러나 사람이면 누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살고 있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길을 이미 간 사람들이 있다. 우리 성당에는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 봉안당 ‘하늘의 문’이다. 그곳에 계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웃고 계신다. 모두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신 분들이다. 그분들은 세상에 와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바쁘게 살다가 나이 들고 병이 들어 앓아누워 있다가, 때가 되어 조용히 눈을 감고 살던 세상을 떠나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숨이 코끝에서 사라지면, 생전 처음 보는 이의 손에 의해 몸이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진다. 이처럼 이 세상에 왔다가 각자 할 일을 하고 나면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평생 품고 살았던 육신과 헤어지며 이 세상을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이다. 100세에 그 문턱을 넘든, 젊은 나이에 그 문턱을 넘어서든 무엇이 다를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만 살아온 그분들의 눈에는 지난날들이 너무나 작고 하찮게 보일 뿐이다. ‘하늘의 문’에는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막내 사위도 있다. 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나 형님, 누님으로 모셨던 어르신들도 몇 분 계신다. 미사 참례를 하면 거의 매번 ‘하늘의 문’에 들른다. 아는 이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하늘의 문’에 들어서면 여름에는 바닷가에 온 것처럼 시원하고, 겨울에는 포근한 산속 오솔길처럼 편안하고 아늑하다. 성전과 하늘의 문은 이렇게 문턱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산 이와 죽은 이는 이렇게 늘 같이 있는 것이다. 아는 분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안부 말씀을 나눈다. 모두 웃으시며 나를 반기시는 듯하다. 어머니와 사위 앞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내 속사정을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느님께 기도 부탁도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 죽은 이가 죽은 이 같지 않다. ‘하늘의 문’을 들어서면 죽은 이들의 세상이고 나오면 산 이들의 세상이다. ‘하늘의 문’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활기찬 젊음과 사랑과 애틋한 정이 있었지만, 때가 되면 갖가지 방법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고, 그다음에는 담담한 마음으로 이곳으로 오신 것이다. 그분들은 지나간 세월이 즐거웠건 슬펐건, 굽이치는 세월을 이리저리 접어 차곡차곡 기억의 창고에 넣어두고 지금은 이렇게 웃고 계시는 것이다.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거나 그렇지 못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았거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때뿐이었다. 오늘도 미사 후 들렀다가 나오는 ‘하늘의 문’에서 “어이! 베드로! 잘 가고 또 와!”하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하늘의 문’에 올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다. “사람 사는 길은 사람은 모르는 길이다. 그 길을 가는 나에게 찾아오는 오늘을 정성으로 맞이하고 멀어지는 오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자.” 글 _ 배현우 베드로(의정부교구 신곡2동본당) |
|
| [가톨릭신문 2025-11-19 오전 9:12:31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