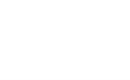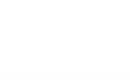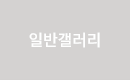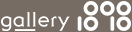-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 160년 전 편지에 새겨진 두 신부의 우정과 신앙 | 2025-09-17 |
|---|---|

칼레 신부가 미리내와 상해에서 보낸 편지 “찬미 예수!”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맞아 역대 교황 최초로 방한한 첫날인 1984년 5월 4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환영하는 인파에 또렷한 한국어로 인사했다. 곧장 신자들로부터 우렁찬 대답이 돌아왔다. “아멘!” ‘찬미 예수’와 ‘아멘’은 박해 시대부터 시작된 한국 교회의 고유한 인사말이다. 이 인사말은 이틀 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성인품에 올린 제4대 조선대목구장 베르뇌 주교와 동료 선교 사제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록한 인물이 바로 칼레 신부였다. 1862년 10월 미리내(경기 안성)에서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미리내를 비롯한 한강 이남 경기도는 칼레 신부의 첫 사목지였다. 그는 고향 크리옹본당 주임 드랑통 신부에게 쓴 편지에도 한글로 ‘찬미 예수’라고 적으며 이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고해성사를 보러온 일고여덟 살 아이들이 십자가에 절하며 온 마음을 담아 ‘찬미 예수’라고 말할 때는 웃음이 나옵니다.” 이후로도 칼레 신부는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와 고향에 편지를 꾸준히 써서 보냈다. 병인박해 중 소학골(충남 천안) 교우촌에 숨었을 때도, 중국으로 피신하고서도 마찬가지였다. 파리외방전교회 상해대표부에 머물던 1867년 1월 20일 그는 프랑스 중동부 부르고뉴 지방의 중심 도시인 디종으로 편지를 부쳤다. 수신인은 드 브르트니에르 남작 부인. 병인박해 순교 성인이자 칼레 신부와 남다른 인연을 지닌 젊은 선교사의 어머니였다. 
드 브르트니에르 신부와의 재회 1865년 5월 27일 조선에 입국한 그 사제의 본명은 ‘시몽 마리 앙투완 쥐스트 랑페르 드 브르트니에르’다. 한국 성은 백(白). 「조선왕조실록」 등 관변 사료에는 ‘백(白) 유시도마야’로 기록됐다. 쥐스트(유스토)와 마리(마리아)만 딴 것이다. 편의상 그를 ‘유스토 신부’라 부르겠다. 칼레 신부는 남작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 유스토 신부와의 인상적인 추억을 적었다. “서울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제 목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전부터 알았다고요. 그리고 저를 따라 조선에 왔고, 제가 자주 머물렀던 수도 서울에서 지내고 있다고요. 알고 보니 제가 1860년 7월 25일 파리외방전교회 성당에서 선교사 파견 예식을 할 때, 발에 입을 맞춘 신학생이 바로 유스토 신부였습니다. 그는 그때 파리 근교 이시의 쉴피스회 대신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저한테 ‘어디로 가시냐’고 묻자 ‘조선에 간다’고 답했는데, 유스토 신부는 ‘저도 선교 사업에 헌신하기를 오래전부터 갈망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선교사는 금세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유스토 신부는 동기 사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칼레 신부를 재회한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얼마 전에 칼레 신부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놀라울 만큼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베르뇌 주교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분은 주님의 가까운 친구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선을 베풀며,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건강한 선교사들 못지않게 부지런히 일하신다고 합니다.” 1866년 3월 7일 브르트니에르 신부가 28세 나이로 베르뇌 주교와 볼리외·도리 신부와 함께 새남터에서 순교하면서 이승에서의 우정은 막을 내렸다. 대신 칼레 신부는 훗날 프랑스로 돌아간 뒤 남작 부부를 방문했다. 160년 만에 브르트니에르 저택서 다시 만나 칼레 신부와 박상근(마티아) 복자 후손들도 지난 7월 20일 160년 만에 유스토 신부 후손을 만나려 브르트니에르 저택을 찾았다. 디종에서 10여 ㎞ 떨어진 곳으로, 유스토 신부가 유년기를 보내며 선교 사제의 꿈을 키운 장소다. 인근 성당에는 그의 성해가 안치돼 있다. 18세기 지어진 고풍스러운 저택에 들어가자 유스토 신부 초상화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후손인 마르크씨 부부가 순례단을 반갑게 맞았다. 그런데 이들의 성은 드 브르트니에르가 아닌, 드 생믈뢰크였다. 유스토 신부의 2살 터울 남동생 크리스티앙은 형을 따라 사제품을 받고 고향 디종교구에서 활동했다. 그래서 한 명뿐인 사촌 남동생이 작위를 계승했으나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드 브르트니에르 가문은 대가 끊겼고, 저택은 방계 후손 소유가 됐다. 마르크씨는 유스토 신부의 사촌 여동생의 고손자다. 마르크씨의 어머니도 103위 시성식이 있던 1984년 한국 순례단이 이곳 저택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추억을 회고했다. 순례단이 한복을 입은 성모자상을 선물하자 무척 기뻐했다. 
편지와 환도 환대 분위기가 무르익자 마르크씨가 가죽 공책과 조선 환도, 그리고 사진첩을 가져왔다. 공책은 칼레 신부가 드 브르트니에르 가문에 보낸 편지 104쪽을 모은 것이었는데, 한글로 ‘백(白) 신부’라고 적은 점이 눈에 띄었다. 환도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한 물품으로, 당시 군종 사제가 양도한 것이었다. 칼집에 ‘辛丑改備江華庫藏(신축년에 다시 갖춰 강화 무기고에 보관)’라고 쓰여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781년 강화도 창고를 정비할 때 채워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첩에는 1910년대 조선 모습을 담은 일본 엽서와 함께 불어 설명이 첨부됐다. 1911년 8월 유스토 신부의 당질녀(사촌 여동생의 딸)인 드 르농쿠르 자작 부인이 남편과 함께 조선을 방문했을 때 사온 것이었다. 드 르농쿠르 자작은 중국 천진에 주둔 중인 프랑스 식민군(현 해병대) 장교였다. 부부는 유스토 신부 성해 송환 작업을 위해 방한했다. 
받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새남터에서 순교 후 왜고개에 안장된 유스토 신부의 성해는 1899년 10월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발굴돼 용산 예수성심신학교로 옮겨졌다. 별명이 ‘키다리’인 그의 신장은 176㎝로, 당대 프랑스 남성 평균 키보다 10㎝ 정도 컸다. 이어 성해는 1900년 9월 명동대성당 지하로 이장됐다. 이후 조선 교회가 시복 움직임을 보이자, 일흔이 넘은 동생 크리스티앙 신부는 서둘러 형의 성해를 돌려받고 싶어 했다. 병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크리스티앙 신부는 옛 저택을 고쳐 만든 학교에도 형의 유품을 모아 생전 방을 재현했다. 하지만 교황 파견 선교사의 유해가 선교지를 떠나는 경우는 유례가 없는 일. 시복·시성을 위한 유해 조사가 어려워질 것도 자명했다. 그래서 조선대목구장 뮈텔 주교는 성해 양도를 거절했다. 크리스티앙 신부는 포기하지 않고 교황청에 탄원서를 내 중재를 요청했다. 긴 싸움이 시작됐다. 그가 국무원 총리 메리 델 발 추기경까지 만난 끝에 비오 10세 교황은 뮈텔 주교에게 성해를 넘겨줄 것을 명했다. 그렇게 1911년 8월 31일 성해는 납상자에 담긴 채 조선을 떠나 프랑스로 향했다. 그리고 브르트니에르 저택 인근 성당에 안장됐다. 성당 내부에는 1984년 시성 이후 마련한 성해함과 함께 유스토 신부의 흉상과 성해를 담았던 납상자·조선 갑옷(두정갑) 등이 있다. 순례단은 이곳에서 순교자를 기렸다. 시골의 오래된 성당에 동료들과 떨어져 홀로 있는 유스토 신부의 모습이 조금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100년 전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한 모양이다. 1925년 10월, 이 성당을 찾은 뮈텔 주교는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며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그가 희생을 마친 곳(조선)에 또 자신도 확실히 거기에 남아있기를 원했을 것이기에 그대로 두지 않은 것을 (후손들이) 유감스럽게 여기는 것을 알게 돼 기뻤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 |
|
| [가톨릭평화신문 2025-09-17 오전 11:12:27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