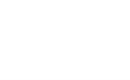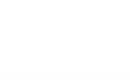-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 [당신의 유리알] 아직도 사랑인가 | 2025-08-27 |
|---|---|
|
어둠이 스며들기 직전, 우리가 탄 차는 노을을 향해 가고 있었다. 주일학교 어머니들은 헌신적이었다. 아이들의 여름 캠프 저녁 식사를 위해 6시간 이상 도로에서 보내고 돌아오는 길. 묵직한 침묵을 깨고 나는 물었다. “사춘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답이 없는 물음에 각자는 기억을 떠올리고… 나 또한 얼마 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밥 먹자’고 했다가, ‘바쁘다’며 거절당했던 일이 생각나 공감을 원했는지 모른다. 어머니들은 어느새 커 버린 자녀들이 자신의 손목을 잡으며 거부 의사를 드러낼 때 상실감이 크다고 했다. 이럴 때는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른다’고 했고, 또 ‘자녀들에게 손목이 잡히면 발로 휘젓는다’고도 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풍경을 이루던 논과 밭은 흩어지고 어둠이 출렁인다. “신부님, 앞으로 애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참 답답해요.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어머니의 입가에는 가볍지 않은 한숨이 흘렀다.  2003년 제작된 안드레이 즈비아긴체프 감독의 영화 <리턴>이 있다. 영화는 12년 만에 어린 형제에게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로 인해 차가워진 집안 풍경을 보여준다. 낯선 아버지는 형제와 친해지기 위해 낚시 여행을 제안한다. 강압적이며 직설적인 아버지의 성격은 형제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영화 속 아버지는 단순히 개인이 아니며, 인간이 늘 갈망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권위적 존재’라고 설명했다. 나는 이미 아이들보다 부모들의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자녀들의 그런 행동이 너무하다고 생각했다. 그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어른이 되어 주길 바랄 뿐. 그러나 이 또한 어른이 만든 인생 설계 중 하나일지 모른다. 나는 어느 편에도 만족스러운 답을 줄 수 없다는 걸 고백한다. 다만 어른들도 베푸는 사랑만큼 ‘존중’을 받고 싶어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무례함’은 사람을 아프게 한다. 그건 자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풍경을 볼 틈도 없이,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답까지는 아니어도 문고리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들자,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돈 보스코 성인이 떠올랐다. 그분이시라면 답을 아실 텐데…. 성인의 영성을 따르는 살레시오 수도회의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이시라면 뭔가 알고 계실 것만 같았다. 얼마 전 후배 시몬 신부는, 수도회에서 어릴 때 축구했던 이야기를 했다. 시골 삼촌처럼 구수하게 말씀하시며 놀아 주시던 양 신부님을 기억한다고. 축구 이상으로 아이들은 그때 존중받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사고뭉치 아이들과 함께 뒹굴며 수도 생활을 한 지 42년 차인 양 신부님께 바로 연락드렸다. 수화기 저편에서 들리는 다정한 목소리. 나는 그 시절 축구 이야기를 비롯하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알고 싶었다. “제가 그때 어려운 친구들을 대했던 마음은 돈 보스코 성인이 말씀하신 ‘환대의 영성’이었습니다. 성인은 이탈리아 고위층이 오든, 뒷골목의 부랑아가 방문하든 똑같은 모습으로 환대하셨지요. 가난한 청소년이 와도 상석에 앉히고 대화에 경청하며 인간에 대한 존중을 표하셨습니다. 아마 저도 축구할 때, 그런 차별과 사심 없이 그들을 대하려고 했을 겁니다.” 지난해 여름, 피정 센터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모습으로 처음 뵈었던 양 신부님께, 어느 순간 나는 부모 측의 변호사가 되어 말썽꾸러기 아이들의 죄를 묻고 있었다. “신부님.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자주 묻습니다. 무턱대고 그들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날 청소년들을 대하실 때도 여전히 ‘사랑’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나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문제’라고 내심 답을 내고 있었다. 양 신부님은 말을 끝까지 들으셨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가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며칠 동안 충남 태안에 있는 살레시오 피정 센터로 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이들을 보면, 존재 자체로 살아 있는 게 ‘고맙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딱하기도 해요. 보통 아이들이 여기 오면, 먼저 전지작업이나 배수로 작업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다 같이 놀러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려운 시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 2인데 ‘희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우울한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영화 <리턴>의 감독은, 영화 속에 여러 회화작품이 떠오르는 구도를 설치해 두었다. 특히 12년 만에 돌아온 낯선 아버지가 낮잠을 자는 첫 장면은, 안드레아 만테냐의 명화 <죽은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한다. 죽은 예수님에 대한 해부학적인 묘사와 인물에 극적인 원근법을 사용해 유명한 작품이다. 이 장면은 ‘아버지’라는 영화 속 인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복선이기도 했다. 형제는 통제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마주하고 갈등하다가 다시 아버지의 부재를 통해 성장한다. 그 모습이 신 앞에 선 인간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변호사처럼 그들의 마음을 읽어 주시는 양 신부님은, 어른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계셨다. “세상은 청소년들을 ‘평가’만 하려고 합니다. 급격한 사회의 성장 속도에 따라갈 수 없는 청소년들은, 말썽꾸러기처럼 행동하고 희망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 ‘최고의 가치’는, 최첨단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살면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쁨과 동시에 고통과 상처가 동전의 양면처럼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이를 너그럽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면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 존재의 약점과 실수, 병고와 죽음까지…. 진정한 관계는 그의 삶 전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세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일지 모른다. 그래도 그 여정 안에서 ‘더 솔직한 대화로 덜 아프게’ 가족은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불쑥 이런 질문에 사로잡혔지만, 묻지 않았다. 세상엔 갈등 없이, 아픔 없이 오는 그런 행복은 없다. 다만 이를 위해 더 깊이 사랑하는 아픔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 글 _ 박홍철 다니엘 신부 (서울대교구 삼각지본당 주임) |
|
| [가톨릭신문 2025-08-27 오전 8:52:23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