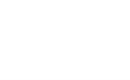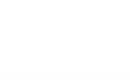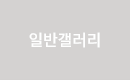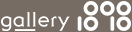-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 성체줄기세포 연구로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 제시 | 2025-05-14 |
|---|---|

3D 바이오프린팅 융합 기술 활용해 심장 근육 조직체 개발 인간 생명인 배아 훼손하지 않고도 인공 심장 개발 초석 다져 “6년간 연구 매진… 갈길 멀지만 미세 혈관 구현할 날 기다려” 대체할 수 없는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서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켜졌다. 제19회 생명의 신비상 생명과학분야 장려상 수상자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장진아(유스티나) 교수에 의해서다. 장 교수는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해 세계 최초로 ‘생체조직제조(Biofabrication)’를 통한 ‘좌심실 비틀림 현상’을 구현했다. 생체조직제조는 3D 바이오프린팅 융합 기술을 활용해 인공 생체조직이나 기관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좌심실은 근육 섬유가 복잡하게 배열돼 특정 방식으로 비틀리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영양분과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섬세한 구조만큼 구현하기 까다로웠다. 그러나 장 교수는 주머니(체임버) 형상을 한 심장 근육 조직체를 개발, 바이오프린팅 기반 인공 심장 개발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체줄기세포 연구로 인간 생명인 배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 희망을 제시한 것이다. 장 교수는 “그동안에는 링이나 스트립 형태의 인공 심장조직을 만들어 근육의 수축 기능을 비슷하게 모사하는 정도였다면, 실제 심장과 같이 혈액을 전신으로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머니 모양을 구현해냈다”며 “이 주머니 형상의 인공 심장조직이 혈액을 쥐어짜듯 발생시키는 힘을 이용해 전신에 피가 돌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 6년간 연구에 매진한 결과였다. 장 교수는 “그럼에도 바이오프린팅 기술 자체가 사람의 인공 장기를 만들어 그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오랜 과정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소재와 세포, 프린팅 기술, 분석까지 하나의 인공 장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분야를 깊이 알아야 하는 바이오프린팅 기술 특성상 지난한 인내가 계속 동반돼야 하는 것이다. 장 교수는 “우리 연구실의 황동규 박사가 이 연구를 맡아 추진해 결론까지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세포가 저희 바람대로 잘 작동해주지 않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이를 딛고 기능을 가시화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도구를 개발해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기능이 구현된 인공 장기를 실제 인간의 장기 크기까지 키우는 것도 바이오프린팅 기술의 산적한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크기의 살아있는 인공 장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람의 엄지손톱 정도의 크기”라며 “큰 크기의 장기를 살릴 수 있는 혈관을 세심하게 형성하고, 그 사이사이에서 작용하는 조직을 잘 결합하려면 바이오프린팅과 더불어 줄기세포 기술이 잘 접목돼야 한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바이오프린팅 기술력은 굵고 큰 동맥혈관류들을 만들 수 있는 정도”라며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작은 미세 혈관을 구현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생명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는 만큼 뚜벅뚜벅 나아가는 중이다. 장 교수는 “소이증으로 태어난 어린아이의 귀를 연골세포를 넣은 바이오프린팅으로 재건해 이식한 사례나 후두암 수술을 받으면서 평생 목에 구멍이 난 채 살아야 했던 환자에게 인공 기도를 이식한 사례 등을 접했을 때 기뻤다”며 “제가 몸담고 있는 바이오프린팅 기술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더 나은 삶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계속 나아갈 동기는 충분하다”고 미소 지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
|
| [가톨릭평화신문 2025-05-14 오후 2:32:15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