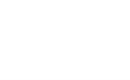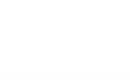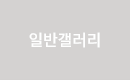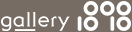-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 [과학과 신앙] (24) 사람 눈이 두 개인 이유 (전성호 베르나르도, 경기 효명고 과학교사) | 2025-04-02 |
|---|---|
 사람의 눈은 왜 두 개일까? 과학책에서는 이 질문에 원근감과 입체감을 더 잘 느끼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하지만 이것은 눈이 두 개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누가 또는 무엇이 사람의 눈을 두 개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근원적 물음에 과학은 아직 답하지 못한다.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장점은 명확하다. 두 눈과 물체 사이에서 형성되는 각도를 광각(光角)이라 하는데 광각의 크기에 따라 뇌에서는 물체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인지한다. 눈과 물체의 양 끝에서 형성되는 각도는 시각(視角)이라 하는데 물체의 크기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눈은 빛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로서 사물의 형태나 색을 감지하고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지만, 모든 동물의 눈이 사람 눈처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물속에서는 멀리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여 대부분 어류는 가까운 물체만 식별할 수 있는 근시(近視)이며 눈에 색을 감지하는 세포가 없다. 양서류인 개구리나 파충류인 뱀의 경우도 불완전한 눈의 기능으로 인해 다른 감각기의 도움을 받아야 먹이를 식별하며 색 구별을 못 한다. 조류의 경우는 사람보다 5∼10배 정도 멀리 볼 수 있는데 하늘을 날며 높은 곳에서 먹이를 찾아야 하는 생존 조건과 관련 있다. 포유류인 개의 경우는 빨간색을 구별하지 못해 사람의 적록색맹과 유사한 시각을 갖고 있으나 뛰어난 코의 후각과 귀의 청각이 눈의 불완전함을 보완한다. 오직 인간과 침팬지 같은 일부 영장류만이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색을 볼 수 있으며 앞을 향한 두 눈으로 원근(遠近)감을 인지하고 사물의 크기를 파악한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발달한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상과 타인에 대한 본질적인 원근 조절에 종종 실패한다. 세상에는 멀리서 봐야 제대로 보이는 것이 있으며 반대로 가까이 클로즈업해야지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자신의 내면으로는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구석구석 성찰하고, 타인의 잘못이나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져서 전체적인 윤곽을 봐야 한다. 인터넷에 악플을 올리는 사람들, 남의 잘못에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는 가까이 다가간 적 있을까? 매주 한 번 수채화 수업에 간다. 스케치북에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제대로 채색되는지 고개를 갸우뚱할 때 미술 선생님께서는 자주 “가까이서만 보면 안 보여요. 조금 멀리 두고서 보세요”라고 말씀하신다. 요즘 이 말의 의미를 자주 되새김한다. 세상일과 타인에 대한 원근 조절이, 정신의 시력이 필요하다. 이번 주 사순 제5주일 복음에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죄지은 여자를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요한 8,7)라고 하시자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요한 8,9) 타인의 잘못을 가까이 들여다보고 비난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 가까이 보는 내면의 원근 조절이 필요하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마음의 시력을 잃고 멀리서 봐야 할 것은 너무 가까이서 크게 보고, 가까이서 봐야 할 것은 너무 멀리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성호 |
|
| [가톨릭평화신문 2025-04-02 오후 2:32:04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