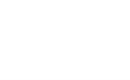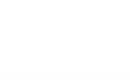-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 [박성호 신부의 철학 일기] 그 기호(sign)를 넘어 | 2024-10-02 |
|---|---|
 할 일이 가득한 토요일 오후 점심시간, 교내 교수 식당에서 신부님 한 분이 반갑게 맞으시네요. “박 신부님, 오후에 테니스 한 판 하입시다. 세 사람 모였으니 신부님 합류하시면 복식 한판 되겠심더.”, “아, 예?.” 저도 참 좋아하는 테니스, 하지만 읽어야 할 글들을 뒤적이다가 찝찝한 낮잠을 자 버린 후라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밥을 떠서 자리에 앉았는데, 웬걸, 창 밖에 후두둑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신부님 왈 “금방 그칠 낍니더. 좀 있다가 칩시다.” 그러더니 또 다른 신부님이 정겹게 제안하십니다. “비가 주룩주룩 와 버리네. 쩌어기, 드들강변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해 불까요?” 저는 테니스에서 커피로 슬쩍 갈아탈 양으로 “저는 둘 중 하나만 해야 할 것 같네요” 하고 한마디 던졌지만, 눈치 없으신 우리 신부님 왈 “그러면 테니스 치는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면 어떨까요? 그럼 둘 다 할 수 있겠구만.” 하여 오붓하게 카니발에 신부 여섯 명이 뚝방길 십 분여를 달려 카페로 향했죠. 광주대교구 한 분, 마산교구 두 분, 전주교구 두 분,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가득 찬) 프란치스칸 한 마리. 커피 주문하고, 먹성 좋은 신부들, 방금 점심 먹었는데 큼지막한 크루아상하고 애플파이도 서너 개 주문해서 이층으로 올라가는데, 우와, 통유리로 사방이 탁 트인 경관에 큰 숨을 내 쉬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둘러앉으니 때마침 후두둑 쏟아지는 비. 말소리·찻잔 소리·큰 소음·작은 소음을 다 품고 한참을 내립니다. 창 밖을 말없이 바라보던 젊은 신부님 한 분이 입을 여십니다. “저는 요즘 법문이 좋더라고요. 장거리 운전할 때면, 법상 스님 법문 말씀 틀어놓고 ‘아 그래, 맞네맞네’ 하면서 공감하며 듣습니다.” ‘광주 신학교 신부들, 사상검증 한 번 해야겠습니다~’ 하고 농담 한마디 하려다가 저 너머 유유히 흐르는 드들강, 그 위로 내리는 빗줄기에 제 농담이 참 천박하게 느껴져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속되는 신부님의 법문 말씀.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법칙은 없답니다. 이렇게 실재들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이 모두 허망한 ‘분별심’에서 나온 것이라 하고요. 원래 나눌 수 없는 실체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어 좋은 것에는 집착하고 나쁜 것은 배척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우리를 참된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뭘 성취하려고 아등바등하지 않고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좀 내려놓고 살려고요.” 구수하게 펼쳐 놓으시는 법문 한 자락에 남도 신부들의 한바탕 이야기 꽃이 핍니다.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고, 저는 1학년 신학생들과 수업 중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1권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하느님을 뜻하는 많은 말이 있지만, “한 잔 더 해~”라고 할 때, 그 ‘잔’은 잔이 아닌 술을 뜻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언어를 넘어, 그 기호를 넘어,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관상해야 한다는 것. 제 앞에 놓인 일들도 그것들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려는 것인데, 그 일들에 매여 허우적대고 있었으니. 그러게요. ‘할 일이 많은’ 토요일에, 제 마음은 또 부글거리고 있었네요. 제 마음은 일을 향했고, 하느님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커피 잘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비가 그치질 않았죠. 그날 테니스 게임은 그렇게 무산되었지만, 한 게임 신나게 치고 싶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쁘게 힘을 쏟고 있는 일들 모두가 그 너머 그분을 만나는 여정임을 잊지 않을 때 조금 더 느긋하게,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
|
| [가톨릭평화신문 2024-10-02 오전 9:52:13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