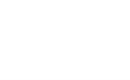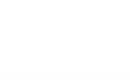-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 [말씀묵상]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 경축 이동 | 2024-09-11 |
|---|---|
 신부님, 교목실 창문 너머에는 목련 나무 한 그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목련은 신학교 성당 곁에도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몇 해의 봄을 지나면서도 그 나무를 피해 다녔습니다. 꽃이 만개했을 때도, 애써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날아오를 듯, 포롱포롱 가지마다 핀 하얀 꽃잎들이, 질 때만큼은 너무나도 서글펐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올해 봄에는 무언가 홀린 듯이, 목련 지는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얀 꽃잎이 녹슬어 떨어지는 모습은, 목이 잘리어 피를 흘리는 것 같았고, 저는 문득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목련이 피를 흘리며 지고 나니, 봄이 왔습니다. 봄을 알리는 그 꽃은, 봄이 만개할 때는 자취를 감추더군요. 학교 앞뜰에 벚꽃이 만개할 무렵 존재를 감춘 목련은, 여름 뙤약볕 아래 잎을 돋우어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그 앞을 뛰어다니며 웃음 지을 것이고, 그 앞을 지나 성당에서 두 손을 모을 겁니다. 신부님, 당신이 목을 떨군 그 땅에, 교회는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찾지 않는 여름 목련 아래서, 당신을 기억합니다. 신부님과 동료 순교자를 기억하는 오늘, 교회 공동체는 루카 복음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말씀은 송연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목련꽃을 애써 피하고 다닐 무렵,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른 정신을 가진 맑은 청년이 내몰린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바른 소리가 싫어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 억울한 죽음을 마주했다면, 다시는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목도한 사람들은, 다시 그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고통의 의미를,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신앙이 그런 방식으로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때마다, 사람들은 스러져갔습니다. 우리 신앙은 왜 이리도 사람들의 고통에 관대한가. 신앙은 왜 고통을 예방하려 하지 않는가. 피로 새겨진 저 말씀을 눈물로 닦으며, 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럴수록, 저 문장은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름 목련 나무 앞에서, 다시 성경을 폅니다. 말씀 구절을 찾아봅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십자가를 ‘지다’를 표현하기 위해 ‘아이로’(α?ρω)라는 낱말을 썼습니다. 이 단어는 ‘짐을 짊어지다’는 뜻입니다. 이 낱말에는 무게를 견디어 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카 복음사가는 복음 어귀에, 다시 한번 십자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27) 오늘날 성경이 ‘짊어지다’로 번역하는 이 낱말은 ‘바스타조’(βαστ?ζω)입니다. 이 단어도 ‘옮기다’, ‘참다’, ‘짐을 지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어감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안고 간다는 뜻에 가깝지요. 아기 엄마가 젖먹이를 품에 안고 갈 때, ‘아이로’보다는 ‘바스타조’에 가깝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아마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십자가라는 형벌도구를, 아이를 품듯 하라니요. 그런데, 이 ‘바스타조’라는 낱말은 로마서에 다시 등장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나약한 이들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로마 15,1) 바오로 사도는 나약한 이들을 보듬는 일을 표현하고자 ‘바스타조’란 낱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를 지다’는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누군가의 어려움과 고통을 돌본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루카 복음사가가 십자가를 대하는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 두 단어를 오가는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또렷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 것이고, 그것을 견디어 낸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 소중히 끌어안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운명을 피할 길이 없다면, 저는 끌어안는 쪽을 택하려 합니다. 신부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낭랑하게 들립니다. 교실 창가로 아이들이 보입니다. 교실에 걸린 십자가 아래로, 아이들은 따뜻한 햇볕을 책상 위에 펴고, 책을 읽거나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이곳의 오늘은 안온합니다. 당신이 꿈꾸었을 일상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숨어서 신앙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손에는 한글로 된 성경이 들려있어서, 마음껏 성경을 소리 내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꾸벅꾸벅 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로서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리셨나요. 어떤 힘을 내는 말이었나요. 저는 신부님의 삶과 꿈, 희망과 좌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안온함은 어제의 절박함과 너무 멀고, 저는 그 소슬한 거리를 좁히지 못해, 격절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야 저는 어제의 서운함이 부끄럽습니다. 신부님, 어느 날 무심한 눈길이 목련에 가닿는다면, 저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포개어 두고, 삶과 꿈을 다시 성찰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른 봄의 목련꽃처럼 행하신 사제직을, 저는 여름 목련처럼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품에 꼬옥 안고, 자박자박 걸으며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글 _ 전형천 미카엘 신부(대건중학교 교목실장) |
|
| [가톨릭신문 2024-09-11 오전 10:52:08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