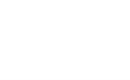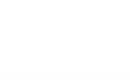-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 태국에서 만난 라오인 | 2024-08-07 |
|---|---|
|
강렬한 뙤약볕 아래서 체감 온도 39℃를 웃도는 더위에도 온몸을 감싸고 잔디를 심고, 판매를 위한 잔디를 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를 뜨거운 오븐 속에서 사는 것 같은 무리함을 감내하는 이들은 라오스에서 먹고 살 길을 찾아 이웃 나라로 삶의 터전을 옮긴 라오인들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본국에 있을 때보다는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필자도 모자, 팔토시, 긴바지로 햇빛을 차단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다음, 쭈그리고 앉아서 그들과 잔디를 심는 작업을 해봤다. 단 1분도 지나지 않아서 거친 땀이 온몸을 적시기 시작했다. 땀을 닦아내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물속에 잠겨 있는 듯한 느낌으로 견디기 어려워 바로 포기하고 말았다. 이런 더위와 싸우며 일하는 이들의 작업환경은 그야말로 가장 형편없는 상황이다. 깊숙한 마을에 넓게 펼쳐진 일명 ‘잔디밭’이라 불리는 이곳은 개인 차량이 없으면 오가는 길이 거의 불가능한 장소이다. 그래서 사업자는 잔디밭 옆 수로 위에 양철지붕과 양철 패널로 빙빙 돌린 공간을 만들어 숙소로 제공해 줬다. 사실상 햇빛으로 달궈진 양철 한증막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도 이들은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니 감사하다고 한다. 가장 심각한 상황은 이곳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 위생, 음식, 자연 생리 현상 처리 등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 그런 열악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고 웃으며 손 흔들어 주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다. 태국의 1딸랑와는 4㎡이고 이는 1.21평 정도 된다. 1딸랑와에 잔디를 심으면 20바트(한화 약 755원)을 받는다.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잔디를 심은 딸랑와 수만큼 임금을 받는다. 그래서 새벽 햇빛이 달궈지기 훨씬 전부터 부부가 하루 종일 잔디를 심거나, 캐는 작업을 한다. 그래도 겨우 400바트(한화 약 1만5100원)을 받는다. 이렇게 벌어들인 턱없이 부족한 수입으로 5인 가족이 살아간다. 아이들은 어디에서 교육받는지 너무나 궁금해졌다. 아직 가난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의 교육은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 다행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부모는 작은 희망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이른 아침에 앉으면 쓰러질 것 같은 낡은 오토바이로(유일한 교통수단) 인근 학교에 아이들을 데려다준다. 아이들은 언어를 배우고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동시에 배우며 꿈을 계획하고 있다. 방과 후 아이들은 햇빛에 익어진 빨간 볼과 땀 범벅된 얼굴로 먼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온다. 이 길을 걷고 또 걷게 하는 이유는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의 꿈을 이뤄 줄 수 있겠다는 희망의 끈을 단단히 동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었다, “꿈을 이루면 원래 살던 나라로 돌아가겠는가?” 대답 대신 머리를 저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사회주의국가 라오스는 국가 지도자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혁신과 개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는 젊은 일꾼들을 이웃 나라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기에는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타국에서 떠도는 그들이 경제적 활력을 잃은 나의 나라로 돌아갈 꿈을 꾸지 않는 것이다.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는 미래를 향한 젊은이들의 꿈마저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것은 아닌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라는 소박한 기대를 채우고 싶다. 어려운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보자.
글 _ 강성숙 레지나 수녀(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 회) |
|
| [가톨릭신문 2024-08-07 오전 10:12:03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