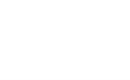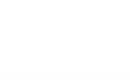-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 [성미술 작가 다이어리] 조숙의 작가 | 2024-08-06 |
|---|---|
  내면을 향한 시선 저는 7남매 중 셋째딸로 태어났어요. 제 위로 셋, 아래 셋, 그 사이에서 말수가 적은 아이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누군가 제게 뭔가를 묻거나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딱히 저를 귀찮게 구는 사람도 없었죠. 그 당시 저희 집안 분위기는 모든 관심이 큰 오빠와 남동생들에게 쏠려 있었어요. 남자잖아요. 공부도 잘했고 기대할만했죠. 덕분에 저는 그대로 좋았습니다. 무관심 속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고 고요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하루 하루 반복되는 일상 안에서, 공상을 즐겼던 것 같아요. 특히 제 존재가 궁금했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할 것인지, 궁극에 어디로 갈 것인지. 의문이 많았죠. 타인은 나와 어떻게 다른지 등, 늘 근본적인 물음 앞에서 홀로 생각에 잠기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인체 조각 운 좋게 미술대학에 들어갔고 조각을 하게 되었어요. 인체와의 첫 대면은 참 놀랍고도 신비로웠어요. 흙으로 인체 조각상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모델링 작업을 해요. 인체의 골격과 근육 등 해부학적인 관찰을 기반으로 하는 인체 탐구는 조각의 기본이죠. 조각에 있어서 인체라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이상적인 대상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여체는 그 순수한 형태, 선, 볼륨과 함께 가장 이상적인 조형의 전형으로 간주 되어 오고 있어요. 조각의 역사 자체가 바로 이 여체의 무궁한 변주로 수놓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 변주는 여체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에 따라 엮어져요. 제가 처음 만든 이 인체 조각은 입상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는 내면화된 형상의 정적인 모습이었어요. 이 작품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형상이 나왔을 때는 늦은 저녁 시간이었어요. 이제 흙으로 빚어진 이 여인상이 마르지 않도록 작품에 물을 잘 분무한 후 비닐로 싸두고 작업실을 나와야 하는데 이날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조각상인 이 여인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흙의 질감 때문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애처롭게 비스듬히 서 있는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여인을 캄캄하고 싸늘한 작업실에 홀로 두고 나올 수가 없어 정말 고민이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날의 그 사랑스럽고도 애련한 인간에 대한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참으로 보석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존엄하지요. 아름다운 천사들임이 틀림없어요. 저는 인간의 이러한 모습에는 하느님의 선하신 모상이 깊이 새겨져 있다고 믿어요. 그날 밤 난감했던 저는 작품 주변을 서성이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밤은 속절없이 깊어만 가고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터덜터덜 작업실을 나왔지만 멀리 어둠에 묻힌 건물 구석진 조각실을 자꾸만 쳐다보았지요. 뭔가를 잃어버리고 나온 사람처럼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는 가방을 뒤적이다 가방을 다시 고쳐 매고 뒤로 뒤로 뒷걸음으로 걸었던 일이 기억나요. 나와 조각 작품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부름에 응답하는 작업 제가 감히 생각지 못한 교회의 과제들이 제게 주어졌어요. 늘 성스러운 작품을 하기에는 저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터여서 당황스러웠지만, 사양할 수도, 반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아, 큰일 났구나!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다른 어떤 일과 다르게 반드시 첫째로 챙겨야 하는 게 있어요. 지극히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저의 정화(katharsis) 작업이에요. 제 내면의 번잡스럽고 속된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하고 떠나고 비워서, 마음을 ‘고요의 상태’로 만들어야 해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거친 저 자신과 사투를 벌여야 하죠. 오직,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며 작업에 몰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베이스 작업이 잘되면 그다음은 비교적 쉽습니다. 제가 맑은 정신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늘 시간이 아쉬웠어요. 아마도 매사가 느린 제겐 언제나 시간이 아쉬울 거예요. (웃음) <가톨릭대학교 개교 150주년 기념 조각> 작품을 제작 설치했고,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정하상 기념 경당의 <정하상 가족상>과 <5인의 흉상>을 작업했어요. 세계 교회사 안에서도 찾기 힘든 유래와 역사를 간직한 정하상 일가를 다루는 것은 제게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서울 명륜동 가르멜 수도회 영성문화센터의 청동문 등도 봉헌했어요. 어떻게 제가 혼자 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항구히 노력해야 하는 일은, 하느님을 섬는 일,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작품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은총에 의해 해결됩니다. 항상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늘 제 마음은 충만함과 설렘으로 가득해요.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술가에게는 자신을 투신해서 이웃에게 꿈을 선물하고 생각의 폭을 넓혀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 조숙의(베티) 작가는 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 |
|
| [가톨릭신문 2024-08-06 오후 6:12:06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