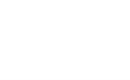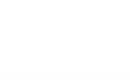-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 [신앙단상] “내 이름은 요세피나야”(송영은 가타리나,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선임연구원) | 2024-07-17 |
|---|---|
 2011년 일본 유학 시절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상생활이 엉클어졌을 때였다. 연구실 서고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언제 올지 모를 여진에 대한 불안감이 어깨를 짓누르던 시기, 정부 장학생들의 휴학이나 해외 장기체류를 허가한다는 공지가 나왔다. 재난 상황을 호기라 할 수는 없으나, 흔치 않은 기회였기에 한 학기 동안 해외연구소 체류를 신청하고 비자를 받으러 서울로 향했다.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문득 본가의 잦은 이사로 미아가 되어 버린 교적을 옮겨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한 민망함에 성당 사무실에서 ‘나 홀로 신자’의 고충을 주절거리다가 ‘아니, 나 혼자가 아니지!’ 싶은 생각이 들었다. “혹시 몇십 년 전에 세례받은 분들 교적도 확인 가능할까요?” 그러자 얼마 전에 옛 기록이 모두 전산화되었으니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동 황간성당에서 세례받은 요세피나를 찾아냈다. 황간성당의 요세피나는 1996년에 하느님 품으로 간 내 어머니다. 나의 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사월초파일에는 연등을 켜고, 팔공산에 가서 치성을 드리며, 매달 고사 떡을 만들고 소지를 태워야 했던 어머니는 결혼 전에 가톨릭 신자였다. 방과 후 부엌 아랫목에서 어머니 무릎을 베고 조잘대고 있으면, 어머니는 가끔 자신이 내 나이였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성당에서 받은 ‘내 이름은 요세피나’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가족·친척 중 가톨릭 신자가 없었기에 사실 요세피나란 낯선 이름은 오랫동안 먼지가 수북한 기억의 창고 저 깊은 곳에 방치되어 있었다. 1998년 세례를 받은 후 나에게 미사와 기도는 하느님께 어머니를 부탁드리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지만, 어머니의 본명을 확신할 수 없어 무언가 항상 개운치 않은 기분이었다. 나는 출국 전 황간성당에 가서 요세피나의 교적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더 일찍 하느님 품으로 가신 외조부모님의 흔적도 보게 되었다. 그때 나는 긴 세월을 건너,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나 개인의 소박한 신앙 기록으로 탈바꿈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무엇보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어린 요세피나가 부모님과 함께 두 손에 성체를 받아 모셨을 그 장소에 앉아 있자니, 내가 세례를 받고 하느님 자녀로 살게 된 것이 내 의지가 아니구나 싶었다. 얼마 후 나는 어머니 교적을 품에 안고 이란의 테헤란으로 떠났다. 낯선 환경에서 좌충우돌하던 중 인터넷에서 황간성당이 방화로 불에 탔다는 소식을 보았다. 내가 다녀가고 얼마 후였다. 요세피나란 이름이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내 기억에 나타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나보다! 더 늦기 전에 가난한 시골마을에서 신부님·수녀님 손을 잡고 신앙공동체를 꾸리던 네 가족들을 보라고, 하느님은 그들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셨다고, 그러니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듯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떠올렸다. 나를 이 먼 곳까지 오게 한 그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재난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역시 홀로 외롭지 않게, 하느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송영은 (가타리나)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 |
|
| [가톨릭평화신문 2024-07-17 오전 7:32:05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