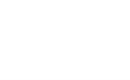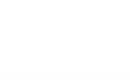-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 [박성호 신부의 철학 일기] 나의 형제 드들강 | 2024-07-10 |
|---|---|
 꽃이 수수한 작은 발코니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지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도시에 있는 산다미아노 수도원,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에서 오른쪽으로 난 창밖을 바라보면 아주 작은 발코니가 있습니다. 몸집이 작은 한 사람이 가만히 앉으면 딱 맞을 만한 공간, 지금은 그 공간을 기념하는 꽃들이 소박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아름답게 펼쳐진 움브리아 평원을 향해 앉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시력을 거의 잃은 눈으로, 그 아름다움 너머에 있는 세상과 자신 간의 형제성을 노래한 「태양의 찬가」를 지은 장소입니다. “나의 주님,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특별히 형님인 태양을 통하여, 찬미받으소서.” 그로부터 800년이 지나 성인과 같은 이름을 택하신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을 반포하셨습니다. 중세와 근대를 넘어 이 시대를 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회칙은, 인간이 곧 자연임을 의심할 이유가 없던 중세의 낭만시인 성 프란치스코께서는 하지 않았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대적 인간 이해의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고민입니다. 중세 이후에 도래한 근대의 사상가인 홉스나 로크·루소 같은 이들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연 상태의 인간을 이성이 덜 발달한 원시인의 상태로 보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문명인들을, 우리 자신의 자연 상태를 ‘극복’하여 문명을 창조해 내는 존재들, 즉 자연을 ‘초월’하는 자연 이상의 존재들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근대의 이해 방식에 따르면, 우리는 자연이 아니라 자연과 분리되어 자연을 지배하는 이들입니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을 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그 대가로 지구라는 이름의 자연이 몸살을 겪는 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지구가 앓으니 우리도 앓고 있고, 우리가 자연과 분리된 존재일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러한 근대적 인간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대적 노력에 성 프란치스코의 비전을 통하여 교회의 힘을 더하고자 하셨습니다. 해·달·별·바람·물과 불을 형제 자매로 삼고, 어머니인 땅과 그 위에 피어나는 꽃·풀·열매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심지어 우리 육신의 죽음까지도 누이라고 부르는 우주적 형제애 말입니다. 생태 환경보존에 공감하는 우리들은 우리와 한 몸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플라스틱 제품을 덜 쓰고, 분리수거를 확실히 하고,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걸어 다니고. 종종 이러한 노력이 그 자체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를 희망하게 합니다. 자연을 나의 이익 증진 수단으로 삼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향유’하는 형제애를 희망합니다. 저녁을 먹고 모처럼 드들강변을 걸었습니다. 광주가톨릭대학교 앞에는 영산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석강이 흐르는데요, 학교 앞을 흐르는 부분은 드들강이라고 부릅니다. “엄마야 누나야”라는 동요 아시죠? 김소월의 시에, 나주 출신 작곡가 안성현이 이 드들강을 배경으로 선율을 입혀 지은 노래랍니다. 제 곁을 유유히 흐르는 이 강을 저는 사랑합니다. 유난히 느린 제 발걸음에 항상 보조를 맞춰주는 제 동생들 같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애잔한 이 노래가 참 잘 어울리는 이 강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품어 주었을까요? 지금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 그를 이제 나의 형제라 부릅니다. |
|
| [가톨릭평화신문 2024-07-10 오전 10:12:10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