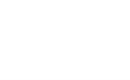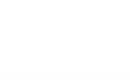-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 전시용 ‘이미지’가 아닌 성령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 2024-07-03 |
|---|---|

“사자를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 보았을까? 대부분 동물원이나 스크린에 갇힌 사자를 보았을 것이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비스킷을 먹으면서 구경하는 동물원의 사자나 소파에 편안히 앉아 보는 스크린 속 사자는 이미 사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사자는 정글 속에 있을 때 진짜 사자라는 것이다. ‘사자다움’을 잃은 관상용 ‘사자’는 사자와 닮은 ‘데스마스크’를 쓴 전시용 이미지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물원이나 텔레비전 앞에서 사자와 교감을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그들은 철저하게 ‘타자(other)’일 뿐이다.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텔레비전에서만 보았던 유명 연예인들과 인터뷰할 때가 있다. 유명인과의 만남은 수녀인 나로서도 긴장되고 설레는 일이다. 그들에 대한 나만의 환상이나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친숙한 느낌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막상 만나면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미디어에서 보여준 당당하고 유머 있고 매력 넘치는 친절한 그들의 모습은 나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여준 모습이 아니었다. 프레임 안에 갇힌 ‘이미지’였고 낯선 타자였다. 물론 카메라가 켜지고 큐사인이 들어가면 그때야 비로소 미디어에서 보았던 익숙한 그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해서 방송이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 싶게 낯선 타자로 돌아온다. ‘이미지’는 기호이며 보고 또 보아도 철저히 타자로 존재한다. 동물원에 갇힌 사자를 보고 오랫동안 눈을 마주하고 바라본들 우린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일 뿐이다. 우리가 매일 뉴스로 접하는 정치인이나 텔레비전·영화 속에 만나는 연예인들 역시 스크린 속 ‘이미지’이며 낯선 타자다. 유명인들은 대중의 신뢰와 인기를 기반으로 돈을 번다. 그런데 그 신뢰와 인기는 ‘이미지’의 힘이기도 하다. 사회심리학자인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은 유명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얼굴 손상’이나 ‘잃어버린 얼굴’이라고 한다. 지켜왔던 좋은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신의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을 불안해한다. 정치인뿐 아니라 모든 유명인의 공통적인 두려움이 아닐까 싶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이미지 관리는 생존의 영역일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체보다 이미지가 더 활력이 넘치고, 진짜보다 이미지와 더 많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간다. 스마트폰을 분신처럼 안고 살아가는 현대에서는 더 더욱 그러하다. 소셜미디어로 인한 이미지와의 교감이 익숙해지면서 보는 것(I)보다 보이는 이미지(Me)에 점점 빠져들어 간다. 보이지 않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어가는 사회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너무도 많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 같다. 유명인은 이미지에 손상이 되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용서’를 청한다. 카메라 앞에 서서 불특정 다수인 대중을 향하여 90도로 고개 숙인다. 그리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사과한다. 이혼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두 사람 간의 문제도 사회적 거대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대중에게 ‘용서’를 청한다. 음주운전이나 마약 혹은 폭력에 연루되면 영락없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서서 고개 숙이고 용서를 빈다. 사건의 당사자와 해결은 잘했는지, 잘못을 충분히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진심일까?’ 사람이 직접 마주해도 말투와 태도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진심이다. 그런데 스크린을 통해 보이는 ‘이미지’에서 ‘진심’ 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다. 어찌 보면 대중이 그들에게 ‘사과’를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만 참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모습을 보고 싶기는 할 것이다. 앞으로도 대중은 유명인들의 ‘사과’를 계속 받아야 할 것 같다. 사과를 받았으면 용서를 해주어야 하는데 미디어에서 보이는 철저한 타자인 ‘이미지’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걸까? 그럼에도 사과도 참회도 전시용이 아니길 바라면서 여전히 묻고 싶은 말, “참회, 하셨습니까?” 영성이 묻는 안부 사람은 누구나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살지요. 때론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겠지요. 용서를 청하면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그런데 용서란 참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참회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중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고개 숙이는 미디어 속 얼굴은 참 잘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고개 숙인 이미지가 너무 커서 ‘진심’이나 ‘참회’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어느 정도 자아를 포장하고 장식하면서 가면을 쓰고 살지요. 그렇기에 가면 속 실존하는 나의 민얼굴을 자주 바라봐야겠습니다. 미디어 속 이미지에 자주 빠져 살다 보면 진정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잃게 되는데요. 자칫 ‘진짜’를 찾는 그리움과 갈망마저 잊고 사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나(spiritual self), 전시용 ‘이미지’가 아닌 하느님의 ‘숨’인 성령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소망해봅니다.  |
|
| [가톨릭평화신문 2024-07-03 오전 10:12:02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