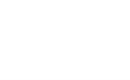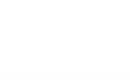-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 [시사진단] 소리와 데모(박상훈 신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 | 2024-05-29 |
|---|---|
 지난 4월 18일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학교 교정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 중지를 촉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로 긴장이 가득했다. 수백 명의 학생이 이스라엘 기업에 투자하는 대학 당국에 항의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모두 함께 모여 하나가 되자’라는 오래된 영가를 합창하며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호소했다. 그런데 이 대학 언어학 교수 한 사람이 이날 자신의 ‘음악 인문학’ 수업에서 일어난 일을 신문에 기고했다. 이 교수는 서양 현대음악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작곡가 존 케이지의 ‘4분 33초’를 주제로 토론하려다 못하고 강의로 메꿨다고 한다. 이 곡은 연주자가 4분 33초 동안 아무 연주도 하지 않는다. 4분 33초간 기침 소리, 의자 뒤척이는 소리처럼 청중들 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연주다. 교수는 케이지가 침묵 속에 주변 소리에 집중하도록 했는데, 들리는 소리는 시위대의 구호뿐이어서 정작 그 곡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주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변 모든 소리가 음악의 한 부분이라고 케이지는 생각했다. 그래서 음악에 ‘침묵’ 같은 것은 없다. 그 교수에게 시위대의 외침은 ‘소리’가 아니었다. 환풍기 소리, 풍경소리, 확성기 소리?. 이런 소리에 집중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다양한 측면을 더욱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다. 어떤 소리든 삶의 맥락 안에서만 의미를 지니며, 그래서 소리는 돈과 지위와 힘의 사회체제 안에 위치한다. 이른바 미국의 ‘엘리트’ 대학에서 이스라엘 폭력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소리가 번져 나갔다. 케이지가 제안한 대로 4분 33초 동안 구호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다면, 그 교수는 지금 상황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간절하고 긴급한 소리는 거의 언제나 묻혀버린다. 그 소리가 현실의 배면을 드러내기에,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곧장 경찰을 불러 학생들을 체포했고, 언론은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급기야 하원은 이스라엘 비판을 ‘반유다주의’라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만들었다. 시위를 주도한 많은 학생이 유다인인데도 그랬다. 우리는 완벽한 것을 말하고 싶은 욕망에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경우처럼 분명한 것도 없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다. 생명의 세계에 외부자란 없으며, 세상 불의는 모두와 연관되어 있다. 학생들은 정학을 당하고 신상이 털렸지만,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들은 가자의 ‘이웃’이 됐다. 한국에서는 대학이 아니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격주로 열리는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그런 청년들로 가득하다. 가만히 있으면서 이웃을 만날 순 없다. 헌신하고 사랑하면서 이웃을 만나는 것이다. 가깝게 다가가 얼굴을 마주 보고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 이웃이란 없다. 여기저기 그치지 않는 참상을 보며, ‘이웃을 찾아 나서고 새롭게 이웃이 되는’ 일의 무게를 생각한다. 학살을 전폭적으로 돕는 나라의 시민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학생들은 적어도 이 시기에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대신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있으려는 마음을 모아갔다. 반전운동에 헌신한 미국 예수회 대니얼 베리건 신부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평화는 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시대에는 ‘좋든 싫든, 우리 삶의 상태 자체가 저항의 상태’여야 한다.(「저항의 어두운 밤」) 충만하고 온전하게 살려면, 이 새로운 국면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 데모가 필요하다. 박상훈 신부 |
|
| [가톨릭평화신문 2024-05-29 오전 7:52:08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