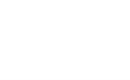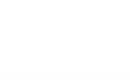-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 몽골에서 23년…그는 낯선 땅에서 ‘아버지’로 불렸다 | 2024-05-22 |
|---|---|
|
[몽골 민경화 기자] 예수님은 허름하고 누추한 구유에서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 입을 것도,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갓난아기를 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자 마음먹었을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 계셨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다.  ■ 한국에서 온 나의 아버지 “신부님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신부님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빈자리를 채워 주신, 우리 아빠입니다.” “담배 피우실 때도, 걸어 다니실 때도 늘 기도하고 계시다고 느꼈어요. 신부님과 만나면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신부님은 게르에서 불피워 밥을 지어 먹고 말 타고 양을 돌보며 몽골 사람처럼 살았어요. 잠깐 들렀다 돌아가는 다른 외국인들과 달랐습니다.” 김성현 신부 선종 1주기를 두 달여 앞둔 4월 1일, 몽골의 봄은 아직 차갑기만 했다. 초원의 봄은 더욱 황량했다. 아직 생명이 자라지 못한 초원에서는 먹지 못해 생명을 잃은 가축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몽골에서 스물두 번의 혹독한 겨울을 버텼던 김 신부도 따뜻한 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삶은 남은 사람들에게 봄을 선물했다. 아버지의 든든함, 친구의 편안함,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김 신부의 삶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몽골교회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2000년 몽골에 도착해 2년 뒤 세운 항올 성모승천성당. 나그네가 쉬어가도록 문을 열어 놓는 몽골 전통 가옥 게르처럼 김 신부는 가장 먼저 성당 문을 열었다.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낯선 몽골에서 성당 문을 두드린 것은 가난하고 갈 곳 없는 이들이었다. 쓰레기를 주워 팔거나, 안전한 가정의 울타리가 없는 아이들에게 김 신부는 “성당에서 같이 살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렇게 12명의 아이들이 모였고 성당 한편에는 아이들의 침실과 공부방이 마련됐다. 그 순간 김 신부는 기도했다. “주님, 아이들을 보내 주십시오, 아이들과 평생 함께 살겠습니다. 이 아이들 중 몽골인 사제가 한 명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 하느님이 몽골에 보낸 선물 성당을 짓고 안정된 공동체를 돌보며 숨을 돌릴 법한 순간, 그는 초원으로 향했다. 몽골에서 선교한 지 16년 만에 도심에서 200km 떨어진 에르덴산트로 떠난 것이다. 전기나 물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했던 시간을 김 신부는 “천국과 같았다”고 회상했다. 안식년과 국내연수로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어교사자격증을 딴 그는 에르덴산트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다. 에르덴산트 사람들은 그를 ‘신부’가 아닌 ‘김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는 좋은 건물을 짓거나 초원에 없는 값비싼 물건을 내밀며 “하느님을 믿어라”라고 말하지 않았다. 평소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했던 김 신부는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함께 살았다. 가난한 이들 곁에 머물렀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에르덴산트에 머물렀다. 에르덴산트에서 김 신부를 만났던 지엑멧 더르지씨는 “김 선생님은 줄곧 공부와 일을 열심히 해서 국가의 발전을 도와야 하고 아이들 공부도 열심히 시키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며 “우리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선생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몽골 바잉허쇼 소피아 본당 주임 노상민(토마스) 신부는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냉담 교우가 많아지자, 신부님은 새로운 선교 방법이 필요하셨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며 “가난의 영성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 사제의 사명이라는 생각에 몽골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고자 에르덴산트로 떠나신 것”이라고 말했다. 생전에 김 신부는 가진 것이 없었다. 추운 나라에서 건강을 챙기라며 가족들이 사준 옷과 신발은 모두 몽골 아이들에게 나눠줬고, 한국 가는 길에 판공비를 아껴 산 선물들은 한국에 사는 몽골인들 것이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 수많은 몽골 사람들이 곁에 남아 있었다. 기숙사에 살았던 아이들에게 김 신부는 “내가 죽으면 항올 성당에 공적비를 세워달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 공세리성당 한편에 세워진 드비즈 신부의 공적비를 보고 “이 심심한 곳에 왜 오셨지?”라며 선교 사제를 꿈꿨던 자신의 과거가 몽골 신자들의 현재가 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몽골에서 만난 신자들은 한결같이 “신부님이 아직도 내 옆에 살아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바람처럼 김 신부는 초원의 바람으로 몽골교회와 몽골 신자들 곁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 |
|
| [가톨릭신문 2024-05-22 오전 10:12:14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