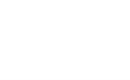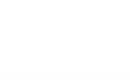-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 [사도직 현장에서] 사별, 그 후 | 2024-05-08 |
|---|---|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기에 3일이라는 장례 기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을 했었다. 부고를 돌리고,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장지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다 보면 정신없이 지나가는 3일. 상조회의 도움을 받고, 장지를 미리 정해두었다고 해도 사별 상실을 나에게 닥친 일로 받아들이고 고인을 잃은 슬픔을 다스리면서 장례를 치르기란 쉽지 않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고인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기억을 통해 고인의 존재가 뚜렷해지는 경험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형식적으로 건네는 위로의 말에 일일이 답하느라 몸과 마음이 소진되기도 한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면 우리 사회는 사별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떠민다. 이런 분위기 탓에 사별은 누구나 때가 되면 겪는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잊힐 일이니 되도록 빨리 괜찮아져야 한다고 사별자도 스스로 다그친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도 바쁘게 살다 보면 잊힌다, 나도 겪어봐서 안다는 말로 일상 회복을 재촉한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만 같아 전화기도 그대로 두고, 사망 신고도 못 하고 있는데···. 애정의 대상을 상실한 후에는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에 사별자는 고통스럽고, 무기력해지고, 떠나간 사람에 대한 기억에 몰두하기도 한다. 사별 상실은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체험이다. 애도의 과정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서로 다르다. 그러는 동안 상실에 적응하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정서적인 능력은 서서히 생겨난다. 그러니 사별 상실을 겪은 분들도, 그들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친구들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 그리고 상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디딤돌이 되고 지팡이가 되려는 이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라. 최남주 수녀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
|
| [가톨릭평화신문 2024-05-08 오전 10:52:04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