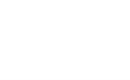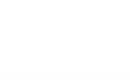-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 [알기 쉬운 미사 전례] 파스카 초의 상징 | 2024-04-24 |
|---|---|
 제단 위에서 빛을 밝히는 파스카 초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옛 추억이 있습니다. 하얀 눈이 덮인 설악산을 보좌 신부님과 선배 신학생들과 함께 등산하면서,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서 없어진 길을 헤치며 오르다가 해가 떨어지며 어두워지는 즈음에 만난 ‘산장의 불빛’이 파스카 초 촛불에 오버랩됩니다. ‘어둠의 골짜기’(시편 23,4)에서 만난 희망의 빛이었지요. 예전에는 ‘파스카 초’를 ‘부활 초’라고 했었는데, 현재 전례서에서는 ‘파스카 초’라고 합니다. 이유는 라틴어 ‘Cereus paschalis’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파스카 신비에서 하나의 사건인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된 수난과 저승에서 살아나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의 파스카 신비’(「가톨릭 교회 교리서」, 1067항) 전체를 드러내는 초의 상징성을 제대로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파스카 초의 유래는 어떤가요? 이 초는 파스카 성야를 많은 횃불로 밝히던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관습에서 유래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 크기의 초로 파스카 성야 동안 하느님의 집에 필요한 빛을 밝히던 로마 관습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축복하는 관습은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 바실리카에서만 국한된 관습이었으며, 5세기까지는 교회 전체에 퍼지지 않았습니다. 갈리아 전례에서 파스카 초는 단 하나의 큰 초로 제한했으며, 갈리아의 신학자들에 의해 광범위한 상징성을 지닌 우의적인 요소들로 초는 장식됐습니다. 그 요소들로써 다섯 개의 향 덩이로 이루어진 십자가와 알파와 오메가와 당해 연도는 자유재량으로 남았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께서 ‘모든 거룩한 밤샘 전례의 어머니’라고 칭송한 거룩한 밤인 파스카 성야에 봉사자들은 성당 앞에 쌓여 있는 장작더미에 불을 지피고, 주례자는 그 불을 축복하여 파스카 초에 옮겨 붙임으로써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 파스카 초는 칠흑같이 어두운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 맨 앞에서 행렬을 이끕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하시고 밤새 앞장서 이끄시며 자유를 향해 밝혀주셨던 불기둥을 연상시킵니다.(탈출 13,21 참조) 다른 한편으로 파스카 초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전에는 자연적으로 불을 얻기 위해 부싯돌의 불꽃으로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불꽃은 돌무덤의 어둠에서 부활하시어 걸어 나오는 그리스도를 연상시킵니다. 파스카 초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한 8,12)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파스카 초를 선두로 제대를 향해 들어가는 행렬은 세 차례에 걸쳐 멈추어 서고, 그때마다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독서대 옆이나 제단 안에 마련된 촛대에 파스카 초를 놓은 다음, 빛의 예식을 마무리하는 ‘파스카 찬송’(Exsultet)을 독서대에서 노래합니다. 곧 파스카 초를 옆에 놓은 독서대는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전례 공간입니다. 부활 시기 동안에 독서대 옆이나 제단에 마련된 촛대에 놓여있는 파스카 초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 지난 후에는 성당에 세례대가 있으면 그 옆에 둡니다. 세례식에서 세례자에게 촛불을 켜줄 때, 파스카 초에서 불을 당겨주고, 장례미사 때에는 파스카 초를 고인의 머리맡에 놓는 까닭은 신앙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곧 교회는 신앙인 모두가 세상에서 ‘파스카 초’가 되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이길 기원하지요.
글 _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가톨릭대학교 전례학 교수)
|
|
| [가톨릭신문 2024-04-24 오전 10:12:11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