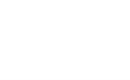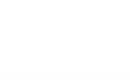-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 [말씀묵상]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 2024-04-19 |
|---|---|
  ■ 어떤 의심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어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토마스가 모진 말을 내뱉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여드레 뒤에 다시 나타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그제야 토마스는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서양말에 ‘Doubting Thoma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토마스’라는 말이지요. 결정적인 증거나 체험 없이는 어떤 것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로 토마스는 불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조금 불편합니다. 토마스를 그저 의심 많은 사람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토마스의 의심을 이렇게 희화화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쩌면 토마스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 의심의 이유 전승에 의하면 토마스 사도는 후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공부를 할 때 인도 신부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같이 공부하던 프랑스 신학생이 농담을 건넸습니다. “인도의 수호성인이 토마스이니, 아마 인도 신앙공동체는 의심이 많지 않나?” 웃자고 던진 말에 신부님께서는 죽자고 답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꽤나 진지한 표정으로 답을 주셨지요. 아버지를 무척 사랑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는 동안 바쁜 아버지가 급히 집을 다녀갔다고 해봅시다. 아침에 일어난 아이에게 다른 가족 모두가 엊저녁에 아버지가 다녀가셨다고 아무리 아이에게 말해도, 아이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혹 믿는다고 해도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인도교회 사람들은 의심하는 토마스의 이야기를, 오히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간절해서, 생떼를 쓰는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토마스는 예수님께 뜨겁고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지방으로 가시겠다고 하자 제자들은 말립니다. 그곳에서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마스는 오히려 다른 제자들을 독려합니다.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요한 11,16) 제자들이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두려워 숨어있을 때, 토마스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복음은 토마스가 무엇을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제자들이 죽음이 두려워 숨었을 때 토마스는 밖으로 나가서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예수님의 면전에서 “하느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토마스가 유일합니다. 과연 토마스의 의심을 불경하다 하겠습니까. 그 의심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은 토마스 자기 자신 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토마스의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사랑이 아닐까요. ■ 의심도 쓸모가 있나요 우리는 사도들이 건넨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느님으로 고백합니다. 사도들처럼, 주간 첫날 바로 이 주일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도 토마스와 같이 뜨겁고 순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희망의 이면에는 의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토마스처럼 주님의 상처를 직접 보고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상처를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하게 되기는 하는 걸까요. 토마스가 의심했다면, 우리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한 사람은 하느님을 마주합니다.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갇힌 사람. 어떤 상황과 사고방식을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이,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신 하느님을 마주합니다. 의심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의심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의심은 무한자 하느님을 마주한 유한자 인간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걷는 동안 자신의 의심을 견뎌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의심을 도구 삼아 하느님께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심은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요한 복음사가는 이 불편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자신의 의도를 덧붙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상처를 내보이셨던 것처럼, 토마스는 자신의 부끄러운 의심을 우리에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모든 것을 기록하여, 우리를 믿음에로 이끌고 있습니다.
글 _ 전형천 미카엘 신부(대건중학교 교목실장)
 우세민 기자 semin@catimes.kr |
|
| [가톨릭신문 2024-04-19 오후 3:09:04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