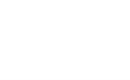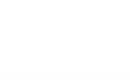-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 [이소영 평화칼럼] 귀 잘린 이의 마음 | 2024-03-27 |
|---|---|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상영할 당시 난 이십 대 초반의 ‘냉담자’였다. 열여덟 살의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도중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한 이후 별다른 계기 없이 무심해졌던 것이면서 남들에겐 멋있어 보이고 싶어 캘리니코스의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을 읽고 나서 신앙에 회의를 느꼈다고 짐짓 꾸며 말하곤 했다. 당시 영화 보러 간 것 또한 신앙심 때문은 아니었다. 연출자의 보수성에 대한 여러 비판을 접하고서 직접 작품 감상한 후 비판자 대열에 합류하고 싶어서였다. 그러다 상영관 조명이 꺼진 후부턴 날 선 비평의 시선은 어디 가고 잔혹한 장면이 나올 기미가 보이면 겁부터 집어먹었다. ‘희생자의 무고함보단 박해자들이 그의 육신에 가한 고통을 선정적으로 부각한 연출이 문제적’이란 평을 읽었기 때문이다. 잔인한 영상 보는 걸 유달리 힘들어하는 터라 심상찮은 배경음악이 흐를라치면 곧장 고개 숙일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과연 초반에 누군가의 귀가 칼에 의해 잘리는 장면이 등장했다. 얼핏 봐도 귀 잘린 극 중 인물은 주연급이 아닌 조연급이었다. 통상 저런 조연급이 피 보면 이를 신호탄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유혈이 낭자해지기 마련이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싶어 고개 숙이려는데 다음 장면에서 주인공이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그 조연급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어 잘린 귀를 도로 붙여줬다. 뜻밖의 전개였음에도 어딘지 익숙했다. 청소년기에 교리 공부를 따로 못한 채 미사만 참여했던 터라 성경의 해당 일화는 알지 못했으나, 그러한 행동은 마음에 익었다. 화면 속 저 사람은 내가 열두 살에 처음 만났던, 한동안 잊고 지내 온 ‘주님’이구나. 연출자의 관점엔 예상했던 대로 반발감이 일었지만, 작품에 대한 평과 별개로 그 장면은 깊이 각인되었다. 냉담을 깨고 성당에 간 것은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루카 복음 수난기에서 잡히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이르신다. 그들이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하자 그것이면 넉넉하다며 더는 언급하시지 않는다. 넉넉하다니 그게 말이 되나 싶었다. 무장한 경비병들이 이내 몰려들 테고 그들 위엔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그들 뒤엔 성난 군중이 있을 텐데 고작 두 자루의 칼로 뭘 어떻게 한단 말인가. 관우나 조자룡처럼 혈혈단신 돌격하여 검 한 획으로 적장 열 명의 목을 날리는 무용담을 펼칠 게 아니라면 말이다. 그 두 자루 중 하나를 제자가 꺼내 들어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 한 번, 단지 한 차례 방어적으로 휘두르자마자 스승은 “그만해 두어라” 반사적으로 제지한다. 겉옷 팔아 칼 사라고 평소답지 않게 명했으나 정작 그 칼과 관련해 그분이 행한 건 하나였다. 다치거나 병든 몸과 마음을 한 채 눈앞에 선 이들에게 그간 항상 해줬던 그것.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 주셨다.”(루카 22,51) 성경을 읽다 이 구절에 이르면 나도 모르게 귓불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귀 잘린 이의 마음에 이입하게 된다. 상관의 명으로 엉거주춤 한쪽에 서 있다가 운 없이 걸려 피 뚝뚝 흘렸을 이름 모를 종 말이다. 높은 나리들이 위험천만하다고 했던 이가 ‘종’인 자기에게 다가와 잘린 귀에 가만히 손 얹어 고쳐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순간은 그의 생에 어떻게 각인되었을까.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라 가르쳤으면서도 막상 대사제 앞에서 뺨을 맞자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반박했던 한 ‘인간’인 동시에, 사람들이 자신을 데려가 죽이려는 와중에조차 종의 귀를 치유할 생각부터 하는 ‘인성’을 지닌 분. 그가 나의 주님이고 나는 그를 사랑한다. |
|
| [가톨릭평화신문 2024-03-27 오전 10:52:10 일 발행 ] | |